내가 살고 있는 건물엔 아티스트가 두명이나 살고 있다. 아니 나까지 하면
세명으로 쳐야겠다.
사실 나는 이웃과 자주 왕래하는 편은 아니다. 요즘 세상 자체도 왠지 그런 분위기가 아닐뿐더러, 내가 유독 개인장소는 공유하는 편이 아니라 더 그렇게 되어 버렸다. 오죽하면 낭트에 1년 반 사는 동안 사람들을 집에 초대한 게 단 한번. 내 생일파티때 뿐이다. 우리집에서 3분 거리에 사는 환희언니는 지인중에 그나마 제일 많이 우리집에 왔는데, 그래도 열번이 안넘을 거다.
어쨌든, 나는 2층에 살고 있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웃집 아티스트는 1층에 살고있다. 그의 이름은 manu. 언젠가부터 건물 마당에 페인트 묻은 물건들이나 신기한 물건들이 조금씩 보이는 가 싶더니, 그가 나타났다. 여름이면 그의 집 현관문은 자주 열려있어 지나다닐 때 어쩔수 없이 내부를 보게되어있었다. 아 집을 참 어지럽게도 해놓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우리가 서로 처음 마주친 날, 그는 자신을 아티스트라고 소개했고, 나는 나를 미술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작업을 보여주며 자신은 "art brut"를 한다고 말했다.
구지 분류하자면 나는 구상화를 한다. 구상화는 추상화의 반댓말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마뉘는 추상화를 한다. 추상화는 상상의 여지도 많이 남겨주고, 참 흥미로운 스타일인 것은 확실하다. 보는이의 경험에 따라 정말 다양한 관람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나는 추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아마 내가 순수하게 색깔과 형태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찾는 스타일이라기보다 내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남들이 이해해줬으면 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지만 사실 스타일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 중 하나다. 마뉘가 처음에 구상화로 미술을 시작했듯이.
솔직히 추상화 아트 거장들의 그림들을 수도없이 봐왔지만, 거기에서 강렬한 감동이라던가 하는 것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었다. (아, 예외적으로 피에르 술라쥬의 회고전은 정말 좋았다.) 하지만, 마뉘의 그림은 꽤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가 쓰는 색의 배합이라던지, 한쪽 표면은 무언가에 긁힌 것 처럼 거칠게 표현하고 한쪽표면은 부드럽게 하는 등의 다양함을 주는 테크닉등도 재미있었다. 한 예로, 노란물감으로 거칠게 표현된 부분은 사막의 모래를, 코발트블루 색깔의 부드러운 부분은 밤하늘을 연상시켜 밤의 사막 풍경을 나타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림(사진1)이 있다. 또 어느 그림은 파도치는 하얀 물결과 분홍빛 바위, 분홍빛 숲을 연상시키기도 한다.(사진1) 밝은 연둣빛과 검정색의 조합(사진2)은 그림을 어느 방향으로 감상해도 그 나름의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나는 위의 그림을 통해 아름답고 어두운 바다를 떠올렸다.
사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그의 삶과 그의 작업들의 관계였다.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내가 샤를르 보들레르의(charles baudelaire) 책 "인공 천국(les paradis artificiels)"얘기를 꺼냈었다. 이는 시인이 시적 창작과 마약에 관계에 대해 적은 에세이다.
마뉘는, 인공천국은 인공이 아니라 진짜다. 라고 했다.
아마도 그는 그 진짜세계를 그리기 위해 취해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자신의 그림을 소개하는 중에도 마뉘는 럼을 마시고 있었다.

photo1
Dans mon immeuble il y a deux artistes, non, trois si on m'inclue.
En fait, je ne suis pas quelqu'un qui fréquente beaucoup mes voisins. Peut-être à cause de l'ambiance du monde actuel, j'ai du mal à partager mon espace privé. Il n'y a qu'une seule fois où j'ai invité des gens chez moi, c'est à mon anniversaire. Fany qui habite tout près de chez moi, est la personne qui est la plus souvent venue chez moi. Mais même pour elle, le nombre de visites ne dépasse pas dix.
J'habite au premier étage et mon voisin l'artiste dont je vais vous parler, habite au rez de chaussée. Depuis un moment, je voyais des objets bizarres ou des pots de peinture dans la cour de l'immeuble.
L'été dernier, il lassait sa porte d'entrée ouverte, donc j'étais un peu obligée de regarder à l'intérieur de chez lui.
Je me disais "je ne sais pas qui habite ici mais c'est vraiment le bazar"
Le premier jour où l'on s'est rencontrés, il s'est présenté comme artiste et moi, comme étudiante de beaux-arts. C'est alors que Manu, c'est son prénom, m'a proposé de regarder ses travaux artistiques. Il m'a expliqué qu'il faisait "art brut".
Si l'on devait distinguer nos styles de travaux, moi je fais plus de l'art figuratif. Pour expliquer très facilement, l'art figuratif est le contraire de l'art abstrait, Manu fait de l'abstrait. C'est un style très intéressant, cela donne beaucoup de possibilités pour l'imagination des spectateurs. Mais je n'ai pas envie de faire de l'abstrait peut-être parce que je ne sais pas comment le faire. J'ai plutôt envie de raconter quelques choses à travers mes peintures aux spectateurs. Alors que le but de l'art abstrait est plutôt de trouver la beauté dans la forme et la couleur. Mais le style est quelque chose de très facile à changer, donc peut-être que dans l'avenir j'évoluerais vers l'art abstrait. Au départ, Manu aussi faisait de l'art figuratif.
J'ai vu pas mal d'oeuvres abstraites, mais Je n'ai pas forcément eu une grande émotion à les regarder.
(par contre, j'aimais bien l'exposition rétrospective de Pierre soulage.) Cependant, en ce qui concerne les travaux de Manu je les trouve intéressant. L'ensemble des couleurs qu'il combine, la technique qu'il utilise, donne une grande diversité à la surface de ses toiles. L'assortiment de coups de pinceaux très rêches à des coups de pinceaux plus doux, me font penser à un paysage de nuit dans le désert avec ces couleurs en or et bleu cobalt (photo1). Une autre peinture contient une forme carré de couleur blanche, qui me fait penser à la mer qui ondule. Des formes roses autour de la masse blanche composent une forêt d'arbres et de roches (photo1). Une peinture d'un ensemble de couleurs noire et verte claire, donne une multitude d'interprétations (photo2). Cela peut devenir une mer noire et un ciel vert clair ou le contraire un ciel noir et une mer verte claire. En tout cas, pour moi, c'était une mer très sombre.
Ce qui est le plus intéressant, c'était le lien entre ses travaux artistiques et sa vie. Nous en avons discuté plus d'une heure. A un moment donné, j'ai parlé du livre qui s'appelle "les paradis artificiels" de Charles baudelaire. C'est un essai où le poète traite de la relation entre les drogues et la création poétique. Là, Manu m'a dit "les paradis artificiels ne sont pas artificiels, ils sont réels et existent vraiment."
Etait-il ivre pour mieux peindre, s'approchant ainsi des paradis artificiels qui lui semblaient bien réels.
Manu buvait même du rum pendant qu'il me présentait ses pein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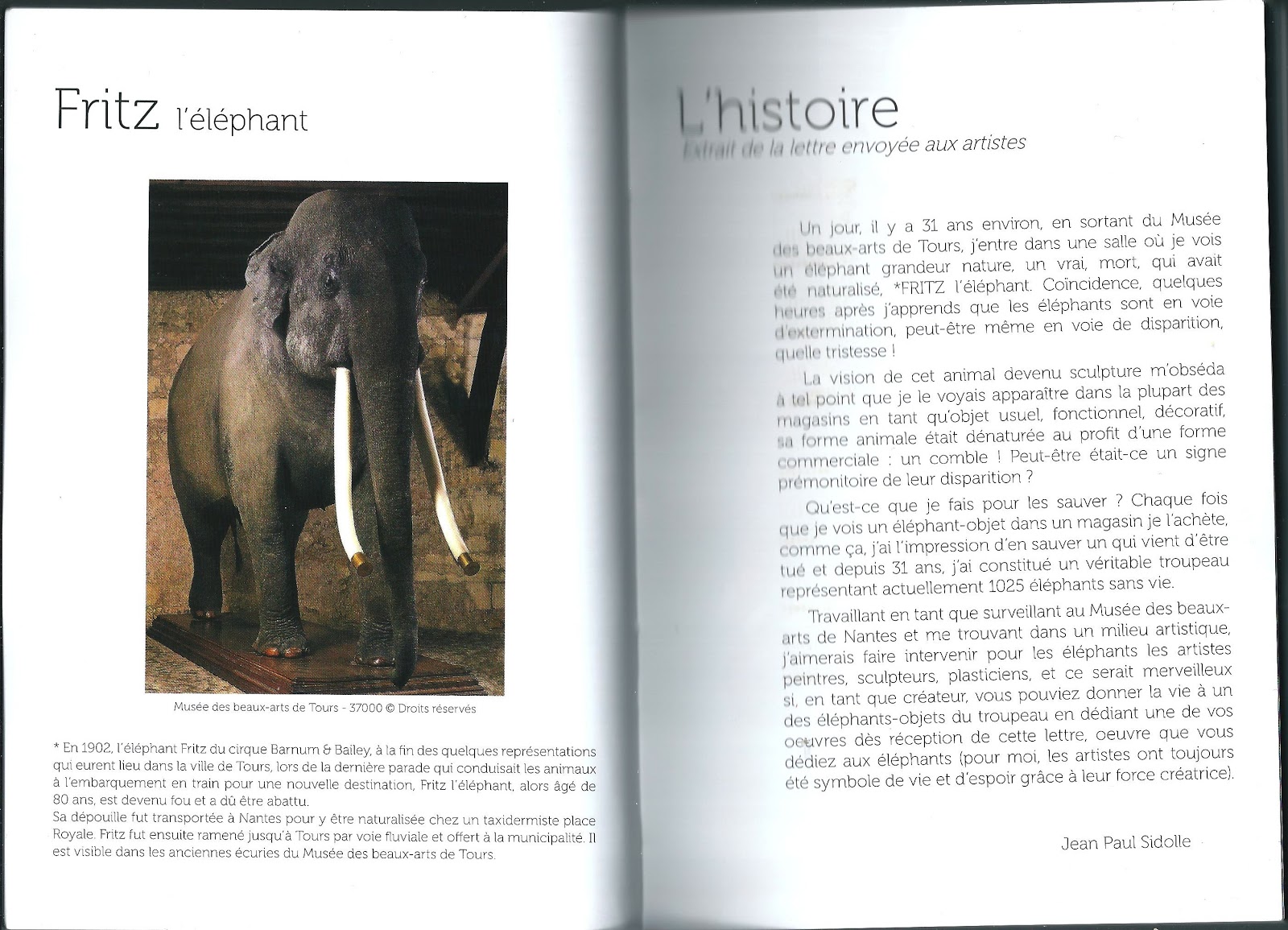
















 photo1
photo1


